독일에 사립학교가 매주 한두 개씩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다. 이와 함께 독일의 교육적 지형도 바뀌고 있다. 공립학교들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지만 사립학교는 매년 80∼100개 새로 문을 열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사립학교를 세우고 있는 걸까? 이들은 예전의 사립학교 설립자들처럼 권위주의에 반대하며 거창한 대안교육을 꿈꾸는 교육철학자들이 아니다. 현재 독일에서 사립학교 설립 붐을 일으키고 있는 주체는 바로 학부형들이다. 이들은 더 이상 공립학교의 교육을 신뢰하지 못한다. 한 달 전쯤 독일의 소규모 도시인 브레멘에서는 공식인가를 받지 않은 사립 초등학교가 14년간 버젓이 운영되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안겨줬다. 공교육을 믿지 못한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학교였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교과과정만 따르는 공립학교 교육은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과 창의력을 앗아간다고 생각하는 학부형이 늘고 있다. 실례로 독일에 잘 알려진 텔레비전 방송 진행자인 요오크 필라바는 13명의 다른 학부형과 함께 직접 사립학교를 세웠다. 마리아 몬테소리의 교육이념을 따르는 작은 초등학교다. 학부형들이 직접 학교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이들은 매달 200유로의 수업료를 지불하면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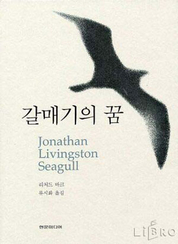
갈매기의 꿈(Jonathan Livingstone Seagull) 1970년대 중후반, 서울 거리 곳곳에는 책을 파는 노점상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 노점상? 이렇게 말하면 제법 좌판을 갖추고 리어카라도 미는 형편의 책판매상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리라. 그러니 급히 정정한다. 널따란 비닐이나 신문지 조각들을 대강 펼쳐서 그 위에 책을 얹어놓고 파는, 그저 꾀죄죄한 행색의 보따리 책장수였다고…. 하지만 필자는 거기서 종종 근사한 세계명작들을 만나곤 했다. 톨스토이의 부활과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입센의 인형의 집, 헷세의 데미안, 여기에 모파상의 목걸이, 오 헨리의 마지막 잎새,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까지, 세계 명작들이 카바이드 불빛에 일렁거리던 길바닥은 보통 사람들의 어엿한 서점이요, 도서관이었다. 조악한 종이에 엉터리 활자들로 어지러운 싸구려 책들이었지만 그들은 늘 이름만으로도 가슴을 뛰게 만들던 세계 명작들이었고, 바로 거기서 필자는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을 발견했다. 조나단 리빙스톤 시걸의 비상(飛上) 갈매기의 꿈의 원제는 조나단 리빙스톤 시걸(Jonathan Livingston Seagull). 번역 제목이 원래 제목보다 더 좋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