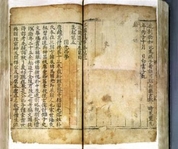
삼국유사는 발간 후 그야말로 형편없는 대접을 받아왔다. 실제로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익까지도 성호사설(星湖僿說)에서 삼국유사는 물론 이를 인용한 학자들마저 강하게 비판했을 정도였다니 일반 유학자들에게 삼국유사가 어떤 존재였는지 쉽게 짐작할 만하다. 또한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활자본을 간행하였으며 최초의 우리말 번역본조차 지난 1930년대 와서야 야담(野談)이라는 잡지에 선보였다니 한숨이 저절로 나온다. 야담이라니! 삼국유사에 대한 관심과 시각은 기껏해야 야담 정도에 머물렀다는 말이다. 심지어 국보(제306호)로 지정된 해조차 지난 2003년이었다. 이는 2002년 MBC 교양 프로그램인 느낌표의 선정도서가 되어 40만 부 이상 판매되고 난 다음 해였다. 그동안 ‘이단(異端)’이니 ‘괴탄(愧誕)’이니 하며 삼국유사를 허황된 저술처럼 철저히 폄하하였다. 민족의 소중한 무한 기억 우리 고전 중에서 딱 한 권만 고른다면? 나는 어느 경우든 주저 없이 삼국유사(三國遺事)를 고를 것이다. (물론 우리말과 글의 자궁인 훈민정음은 제외하고서다) 우리 고전 작품을 이해하는 데 가장 원형의 바탕이 되는 책, 민족의 영원한 기억을 담고 풀어내는 책이 바로 삼국유사이기 때문이
훌쩍 떠나기, 그리고 쥘 베른의 ‘경이의 여행’ 지구본을 손가락으로 돌려본다. 비스듬히 누워 있는 지구가 돌아가면서 둥글게 세상이 펼쳐진다. 익숙한 지명들 사이로 조금만 비켜가도 낯선 곳.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어느 누군들 그러지 않으랴. 아침 출근길에서 또는 답답한 교실에서 문득 먼 하늘 바라보면 어느새 마음은 어디론가 떠나고…. 어느 계절인가 훌쩍 떠난 길. 한적한 강원도의 산간 도로를 미끄러지듯 차로 달릴 때, 온몸에 파고드는 듯한 떨림에 놀란 적이 있었지. 문득 대학 시절 걸었던 긴긴 옛길들, 떠오르고, 하늘 가득 쏟아질 듯 은하수, 젖어 있고, 그 아래 터벅이던 발자국들, 가슴 쿵쾅거리고, 철썩거리던 파도 소리, 발끝을 간질이고, 백두대간의 산맥들에서 뿜어 나오는 나무들의 숨소리. 작은 새의 호흡처럼 이어지던 길. 끝 모르게 펼쳐지던 생각들. 누구나 일상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그러나 누군가는 벗어나 마침내 돌아오고 또 누군가는 벗어나지 못한 채 사라진다. 쥘 베른(Jules Verne·1825~1905).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작품이 번역된 작가. 그는 인류의 가슴에 영원한 여행의 꿈을 심어 준 작가다. 일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사라
논어에 서서히 빠져들다 80년대 중반, 국문학과 대학원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한문에 능통해야 했다. 학부 내내 외국 문학 이론을 배경 삼고 철저한 작품 분석을 통해 언어예술의 심연과 진경을 포착하려 애쓰던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선배들을 통해서 입수한 대학원 입학시험의 한문 문제는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A4 용지 한 장짜리 원문을 한글로 옮겨 내라는 주문이 있는가 하면, 귀거래사(歸去來辭) 같은 작품을 원문 그대로 외워 쓰라는 요구도 있었다. 바로 전해에는 적벽부(赤壁賦)를 외워 쓰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했다. 다행히 고등학교 때 한자 공부를 그럭저럭 한 데다가 어렸을 때부터 온통 한자투성이였던 갖가지 책들을 읽어서 그런지 한문 공부가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다. 대학원에 가겠다고 일찍부터 결심했기에 미리 틈틈이 공부한 것도 도움이 되었다. 대학원 입학시험을 몇 개월 앞두고는 논어와 맹자를 열심히 읽고 또 읽었다. 고문진보(古文眞寶)도 공부했고 시험에 나올 만한 명문들도 외웠다. 다행히 대학원 시험에 통과했다. 대학원에서 현대시를 전공하면서부터 그나마 띄엄띄엄 읽을 수 있었던 한문 해독 능력은 급속도로 사라졌다. 열심히 외웠던 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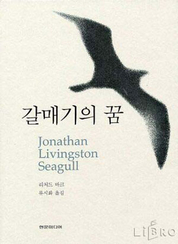
갈매기의 꿈(Jonathan Livingstone Seagull) 1970년대 중후반, 서울 거리 곳곳에는 책을 파는 노점상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 노점상? 이렇게 말하면 제법 좌판을 갖추고 리어카라도 미는 형편의 책판매상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리라. 그러니 급히 정정한다. 널따란 비닐이나 신문지 조각들을 대강 펼쳐서 그 위에 책을 얹어놓고 파는, 그저 꾀죄죄한 행색의 보따리 책장수였다고…. 하지만 필자는 거기서 종종 근사한 세계명작들을 만나곤 했다. 톨스토이의 부활과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입센의 인형의 집, 헷세의 데미안, 여기에 모파상의 목걸이, 오 헨리의 마지막 잎새,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까지, 세계 명작들이 카바이드 불빛에 일렁거리던 길바닥은 보통 사람들의 어엿한 서점이요, 도서관이었다. 조악한 종이에 엉터리 활자들로 어지러운 싸구려 책들이었지만 그들은 늘 이름만으로도 가슴을 뛰게 만들던 세계 명작들이었고, 바로 거기서 필자는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을 발견했다. 조나단 리빙스톤 시걸의 비상(飛上) 갈매기의 꿈의 원제는 조나단 리빙스톤 시걸(Jonathan Livingston Seagull). 번역 제목이 원래 제목보다 더 좋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