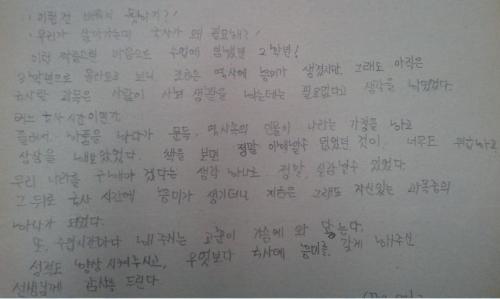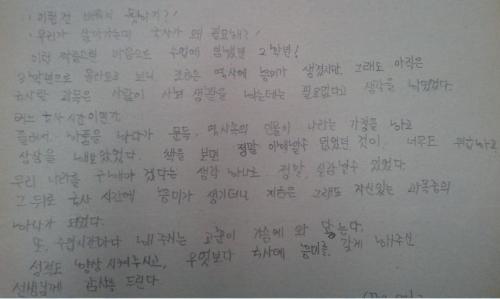공부란 본디 싫은 일이다. 우등생이든 열등생이든 머리가 좋든, 나쁘든 공부는 일단 싫은 것이다. 어릴 적부터 공부가 마냥 즐겁고 행복해서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커 가면서 점차 왜 학습하는 행동에 차이가 나는 것일까? 아이들은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타인의 평판을 아주 다양한 수준에서 의식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의하여 상당한 영향을 받으면서 자란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들의 자라나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아이들은 걷기 하나를 배우면서도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이때 주위 사람들의 격려는 걷기 실력 향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지적인 면에서도 성장 과정에서 영향을 받고 자라는데, 이 과정에 부모, 선생님의 영향이 매우 크다. 유치원에 들어가면서부터 선생님의 위대한 권력을 접한 아이들은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 안간힘을 쓴다. 하지만 선생님의 가르치는 방식, 성격에 따라 크게 차이를 느끼게 된다.
유치원을 거쳐 초등학교, 중등학교를 거치면서 아이들은 수많은 선생님들을 만나 자기의 성장을 도모하게 되는데 적절한 동기부여가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외부의 동기 부여를 내면화 시키는 과정에서 점차 자발성이 길러진다. 가르치는 일은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배우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내적 요인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한다. 가르치는 행위도 어쩌면 아무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설득하여야 수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잘 가르치는 교사는 어쩌면 설득의 달인이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보상받을 가능성이나 행동을 취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강한 동기 유발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수업이라는 과정은 순간순간마다 즉각적 보상을 줄 수 있는 성격의 업무가 아니다. 짧게는 수업시간에 칭찬을 통하여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이 칭찬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을 느낀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과정을 두어 아이들의 성취 결과를 판단하는 과정을 설정한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각성의 단계를 맛보는 아이들도 있고 전혀 접근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 이 후자의 아이들은 정말 가르치기가 어려운데 이것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가능성을 우선시하는 사람이거나 필요성을 우선시하는 사람이다. 전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의 가능성에 따라 행동하지만, 후자는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만 움직인다. 아이들은 좋은 점수를 받고 좋은 학교를 나오면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행동해야 할 필요성으로 연결시키지 못한다. 이 과정에서 가르치는 자의 개입이 필요하다. 흥미 없어 하는 재료에 흥미를 불어 넣어 학습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 성장 단계에 따라 아이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이에 적절한 언어와 자료가 필요하다. 교육이란 삶의 기초를 만드는 추춧돌이 되는 일이므로 교사는 공부를 업으로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우리 교육의 문제는 국제적으로 학업 성취도 결과는는 선진국 수준이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학습 흥미도는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볼 때 현재 시점의 학습 성취도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말고, 성인이 되어 좋은 산출물을 내놓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 할 수 있게 가르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