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학교 방송을 통해 명심보감 정기편 21번째 문장이 흘러나온다. “경행록왈 심가일(이언정) 형불가불로(요) 도가락(이언정) 신불가불우(니) 형불로즉태타이폐(하고) 신불우즉황음부정(이라) 고로 일생어로이상휴(하고) 낙생어우이무염(하나니) 일락자(는) 우로(를) 기가망호(아)” “景行錄曰 心可逸이언정 形不可不勞요 道可樂이언정 身不可不憂니 形不勞則怠惰易弊하고 身不憂則荒淫不定이라 故로 逸生於勞而常休하고 樂生於憂而無厭하나니 逸樂者는 憂勞를 其可忘乎아” 이 문장의 뜻은 ‘경행록에 말하였다. 마음은 편안하게 할 수 있을지언정 육체는 수고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도는 즐길 수 있을지언정 몸에 근심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니, 육체가 수고롭지 못하면 게으르고 나태하게 되어 폐단이 생기기 쉽고, 몸에 근심하지 않게 되면 빠지고 음탕하여 안정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편안함은 수고로움에서 생겨 항상 기뻐고, 즐거움은 근심에서 생겨 싫증이 없으니. 편안하고 즐기는 사람은 근심과 수고로움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문장이 꽤 길고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유심히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역시 대구로 이루어져 있다. 대구의 형태는 같은 대구의 한자(漢字)의 뜻이 같거나
2010-10-14 11:2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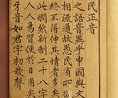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를 한글이라고 한다. 한글은 우리나라의 문화적 수준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세계에서 문자를 직접 만들고 국민이 함께 통일해서 사용하는 나라가 드물다. 유네스코가 발간한 ‘지구의 언어․문화․생물 다양성 이해하기’라는 책자에 따르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는 약 6천700개나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문자를 가진 언어는 300여 개에 불가하다. 그 중에서도 한글은 창제와 관련된 모든 기록이 존재하고 과학적인 문자라는 점에서 세계 유일 문자다. 영국의 옥스퍼드대에서 현재 쓰고 있는 세계의 문자 30여 개를 평가했는데, 한글은 합리성․과학성․독창성 부문에서 최고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세계에서 독창적인 문자를 가진 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가짐과 동시에 우리 문자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고 있어야 할 필요를 느낀다. 여기서는 우리 문자인 한글의 명칭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살펴볼까 한다. 우리가 말하는 문자의 이름을 한글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은 ‘훈민정음’이었다. 훈민정음 정인지 해례 서문에도 글자 이름을 훈민정음이라고 했다. ○ ‘아전하창제정음이십팔자(我殿下創製正音二十八字), 약게례의이시지(略
2010-10-14 11:22훈민정음의 딴 이름으로 ‘반절’이 있다. 이 용어는 최세진이 지은 ‘훈몽자회(訓蒙字會)’에서 나온다. 이 책의 범례에 ‘언문자모 속소위 반절이십칠자(諺文字母 俗所謂 半切二十七字)’라 하여 우리 글자 이름을 반절이라고 칭했다. 이는 東(동)이라는 글자를 德(덕)과 紅(홍)의 합친 글자로 설명할 때 나온 표현이다. 즉, 덕으로서 ‘ㄷ’을, 홍으로서 ‘옹’을 표시, 이를 합하면 ‘ㄷ+옹=홍’이 되는데 이에 동(東)을 德紅切(덕홍절)이라 했다. 다시 말하면, 한글이 자음과 모음으로 음절을 이루는 데서 반절과 같다고 본 것이다. 갑오경장 이후로는 우리말과 우리글을 ‘국어(國語)’와 ‘국문(國文)’으로 불렀다. 당시 국어 문법을 연구한 주시경 선생은 자신의 대부분의 저술에 국어와 국문이라 했다. 이 표현은 주시경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국어의 존엄성을 자각한 다른 사람의 저술에서도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어나 국문이란 말도 국권 상실 이후로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국’대신 ‘조선’이란 말이 쓰이기 시작한다. 이는 1911년 주시경의 ‘조선문법’, 김희상의 ‘조선어전’의 저술이나 1911년 ‘조선어강습원’, 1911년 ‘조선어문회’ 등의 연구 단체에서도 알 수 있다.
2010-10-14 11:22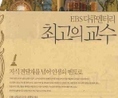
마크 트웨인은 교육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바를 알도록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은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을 때 행동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칼릴 지브란은 "교육은 씨를 뿌릴 뿐 씨 자체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씨가 자라게 하지요. " 라고 정의했다. 표현 방법은 각기 다르지만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일맥상통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에 독립한 나라 중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라고들 한다.그 발전의 원동력은 자녀 교육에 몰입하는 위대한 국민성이라고 생각한다. 거기에는 교육에 헌신한 수많은 선생님들의 노고가 밑거름이 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아직도 불만의 눈초리가 다분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세계적인 교육강국의 면모를 과시하면서도 공교육을 대하는 시선들은 그리 곱지 않은 것이다. 자식들은선생님이 되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다른 선생님을 보는 시선은 매우 비판적이고 냉정한 이중성까지 보여준다. 교직을 바라보는 시각을 서운하다고 탓하기 이전에 나 자신부터 존경받을만한 선생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책을 만났다. 지난 2008년 EBS다큐멘터리로 방영된
2010-10-14 07:57우리학교는 책 읽는 시간이 있다. 아침 수업이 시작되기 전 30분 책을 읽는다. 그리고 20분은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우리학교 학생들은 일주일에 책 한 권은 꼭 읽도록 권한다. 1년에 51권의 책을 읽도록 하고 있다. 왜 쉬지 않고 책을 읽도록 권하고 있나?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책을 읽는데 시간을 빼앗으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우선 책을 많이 읽으면 독해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언어 영역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영역의 과목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책을 많이 읽으면 논리력도 향상되기 때문에 수학에도 도움이 된다. 책을 많이 읽으면 발전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과학에도 도움이 된다. 책을 많이 읽으면 상상력도 풍부해지기 때문에 운문의 글들을 산문의 글로 풀어쓰는 능력도 뛰어나게 된다. 책을 많이 읽으면 이해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다른 과목의 책을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또 책을 많이 읽으면 어휘력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글쓰기에도 도움이 된다. 대학에 갈 때 논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그러면 논리적인 글을 체계적으로 잘 쓸 수 있게 된다. 책을 많이 읽으면 좋은 사람
2010-10-13 12:41
인천과학고 2학년 김은서 학생이 2010 대한민국 인재상(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아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 상은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해 나갈 우수한인재들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김은서 학생은 2010년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국제청소년물리토너먼트(IYPT) 국가대표로 참가하여 First Prize를 수상했고, 교육과학기술부과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제1회 국제청소년학술대회(ICY) 참가, 제29회 인천광역시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미래 과학기술분야 글로벌 리더로서의 성장잠재력과 창의성을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인천과학고는 2008년(이지수), 2009년(김주환)에 이어 3년 연속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를 배출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교육 메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2010-10-13 08:21밥상머리 교육의 중요성 "오메, 우리 2학년은 밥 좀 많이씩 좀 먹으먼 좋겄다잉~ 이쁜 것들이 왜 이렇게 음식을 더 주란 말을 안 한다냐잉~" "아, 예. 우리 반 아이들은 음식을 남기고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 먹는 양을 조절해서 그렇답니다." "오메, 그라요. 나는 내가 해 준 음식이 맛이 없어서 그란 줄 알고 속상했는디! 그라고 보니 우리 2학년 식판은 언제나 깨끗하더만~" "저도 아이들만큼만 주세요.저부터 남기면 아이들에게 할 말이 없거든요. 그리고 욕심의 시작이 음식을 탐하는 데서 부터랍니다. 조금 더 먹고 싶을 때 참을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그래야 자제력이 길러진답니다." 우리 학교에 새로 오신 조리사 선생님이 날마다 하시는 말씀이랍니다.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음식을 들고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나눠 주며 하는 말씀이지요. 음식을 남기면 벌점을 받으니 두 배로 손해가 되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먹을만큼만 받되, 골고루 먹어야하는 학급의 식사 규칙을 잘 따릅니다. 학년 초에는 싫어하는 음식을 먹다가 한 두번 토하던 아이가 있었으나 이제는 그 아이까지도 잘 먹게 되었으니, 요즈음의 우리 반 아이들은 점심 식사 시간을 즐기는 편입니다. 집에서는…
2010-10-13 08:20
사단법인 한국환경교육협회(회장 이진종)와 송우재단(이사장 김성만)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조선에듀케이션, EBS·데일리그린이 공동후원한 제17회 전국 중·고등학교 환경과학 독후감 공모 시상식 겸 2010년 환경교육 장학생 증서 수여식이 10월 10(일) 오전 10시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렸다. 이 날 시상식은 전국 중, 고등학교의 입상자 총82명 중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대상인 환경부장관상에 단국대학교부속고등학교(서울) 1학년 장찬희 / 용인이현중학교 2학년 강민승,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에 경기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박지운 / 풍남중학교 3학년 박유정, 단체부문 대상인 문화체육부장관상에 태안여자중학교등의 학생과 학교, 지도교사가 장학금과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또한 환경교육협회에서 환경교육 분야의 미래 인력을 양성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환경교육 대학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도 같이 진행되어 이치우(대구대학교 환경교육학과), 김태선·임성기(목포대학교 환경교육과), 김종욱(순천대학교 환경교육과), 안슬기(한국교원대학교 환경교육과) 5명이 각 1,500,000원의 장학금을 지급받았다.
2010-10-12 16:032011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서울 52.9대 1 경기 45.6대 1 부산 39.6 대 1, 과목에 따라서는 100 데 1이 넘는 경우도 여럿이 있다니, 직업으로서 교사된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이 간다.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경쟁률보다 훨씬 치열한 교원임용의 좁은 문은 우리 사회의 취업난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능력이 뛰어난 우수교원의 확보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렇게 선생님이 되어보고자 애쓰는 한쪽에서는 고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머리를 싸매고 임용시험 준비하며, 선생님만 될 수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온 열정을 바쳐가며 일 하겠다 다짐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요즘 아이들은 선생님 말을 들어먹지도 않고 걸핏하면 사고나 치니 정말 가르치기 힘들다.'느니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대충 가르치지 뭐.'식의 참으로 배부른(?) 소리를 내뱉는 사람도 적잖이 있다는 점이다. 어쩌면 직업을 가지고 밥 벌어 먹는 일을 하면서 이 세상 힘들지 않는 사람 아무데도 없을 터인데 유독 교직만 더 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2010-10-12 16:02오늘 아침은 전형적인 가을날씨다. 깨끗하고 푸른 하늘, 가을을 수놓는 연한 구름, 가을을 준비하는 푸른 산, 함께 어울려 기쁨을 더해주는 푸른 잔디... 가을잔치라도 베풀려고 하는 것 같다. 오늘도 명심보감을 통한 인성교육으로 하루를 열었다. 방송에서 태공왈, ‘과전에 불납리하고 이하에 부정관이니라’는 문장이 흘러나온다. “太公曰 瓜田에 不納履하고 李下에 不正冠이니라.”는 문장은 명심보감 정기편 20번째 나오는 문장이다. ‘태공이 말하였다. 남의 외밭을 지나갈 때에는 신을 고쳐 신지 말고, 남의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바루지 말라’는 뜻이다. 이 문장 역시 대구로 되어 있다. 瓜田과 李下가 대구이고 不納履와 不正冠이 대구이다. 이들의 문장은 술목으로 짜여져 있다. 不納과 不正은 서술어, 履와 冠은 목적어가 된다. 이것만 유의하면 쉽게 해석이 가능하다. 瓜田은 오이밭이다. 李下(오얏나무 아래)로 장소를 나타낸다. 不納履는 신을 고쳐 신지 말라, 不正冠은 갓을 바루지 말라로 행위를 말한다. 어떤 장소에서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로 해석이 되고 있다. 오이밭에서 신을 고쳐 신으면 어떻게 비칠까? 멀리서 보면 오이밭에서 오이를 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오얏나무…
2010-10-12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