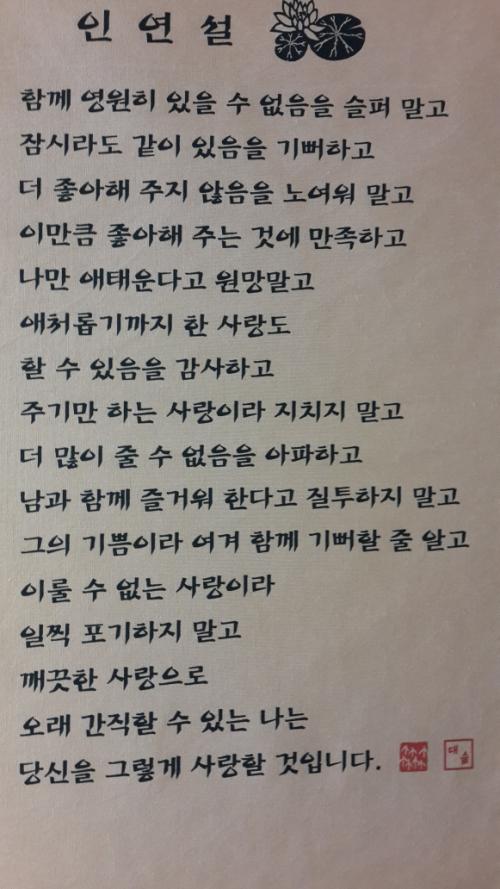신비의 섬, 간월암 일주문아침부터 추적추적 내리던 범비도 그치고 그 비를 몰고 왔던 먹장구름도 자취를 감췄으니, 하늘은 더없이 청명하다. 여행은 날씨가 반 부조(扶助)라는데 하늘도 은연중 불심(佛心)을 찾아 떠나는 여행객을 돕는가보다.
마침 내가 간월암을 찾았을 때에는 썰물이라 손쉽게 걸어서 간월암에 오를 수 있었지만 밀물이 되면 간월암은 그야말로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한 떨기 연꽃이 된다. 그런 때를 대비했음인지 늙은 적송 아래엔 낡은 쪽배 한 척이 외로이 매여져있다.
신기하게도 바다가 잠시 여인에게 잠깐 길을 열었다. 길이 50여 미터 정도의 바닷길이다. 석화(石花)가 덕지덕지 붙은 그 갯벌을 지나자 가파른 계단 위에 빠끔히 열려있는 일주문이 보인다. 그 문을 통과하자 사천왕상도 없이 바로 간월암이다. 말로만 듣던 바다 위에 두둥실 떠 있는 절, 간월암(看月庵). 그 앞마당에 선 것이다. 아, 장쾌하다는 말밖엔 더 이상 형용할 말이 없다. 나는 나직이 박주태 님의 시 ‘간월암’ 한 구절을 암송할 뿐이다.
간월도가 소나무 숲 사이에 떠 있다.
안에는 바다를 바라보는 절이 있어
자꾸 미끄러지는 운명을 불러
그 속을 훤히 떠, 바다를 어루는 밤이면
섬도 몸을 열어 교교한 달빛을
쐬게 되는 것이리라.
철새들의 떼가 바다 위를
가로질러 갔다가는 다시,
제 곳으로 되돌아간다.
박주태 님의 시, ‘간월도’ 중에서
저 멀리 시야가 머무는 곳엔 푸른 물감을 풀어헤친 듯한 서해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섬들이 간월암을 에워싸고 있다. 일망무제! 바로 이런 때를 묘사하라고 만들어진 낱말인가보다. 이처럼 귀한 선물을 주시려고 하늘은 어제부터 그렇게 부지런히 가을비를 뿌리셨나보다.

간월암 경내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행복한 가족들.보면 볼수록 명당이다. 대저, 우리나라 사찰들이 들어선 장소마다 명승대지가 아닌 곳이 어디 있으리요마는, 여기, 간월암처럼 지리와 서기(瑞氣)가 동시에 빛나는 곳도 드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말 세상만사 모든 번뇌를 짊어진 사람들이 이곳 간월암 마당에 서서, 하늘의 달과 그 생생한 달빛에 물든 교교한 바다를 바라본다면 정녕 깨우치지 않을 자가 없을 듯하다. 송만공 선사와 무학대사를 비롯한 수많은 고승대덕들이 이곳에서 온갖 분별과 망상에서 벗어나 성불에 이르게 된 반야(般若)의 지혜를 터득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란 생각이 든다.
필자가 대책없는 감상에 빠져있는 사이 간월암 처마에선 땡그랑 땡그랑 풍경이 운다.
일찍이 태조 이성계의 왕사였던 무학대사가 이곳에 간월암을 짓고 토굴 정진을 하던 때가 약관 이십 세. 하루는 달빛이 하도 사무치게 밝아 대웅전 뜰 앞에 내려서서 서해바다 위에 걸려있는 달을 바라보는 순간 대오각성!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하여 이름을 ‘무학(無學)’으로 고치고 함경도 백연암으로 떠난다.
그곳에서 조선을 건국할 태조 이성계를 만나 그 유명한 이성계의 서까래 세 개를 짊어진 꿈을 해몽하여 그를 태조로 등극시켰으니 사실 조선의 시원(始原)이 이곳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또 한 가지 무학대사에 관한 신기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6백 여 년 전의 일이다. 관청의 돈을 빌려쓰고 갚지 못하여 관가로 끌려가는 만삭의 여인이 있었다. 여인은 학돌재(鶴石峴, 현재 충남 서산군 인지면) 고개 마루에서 모진 산고 끝에 첫 아들을 낳았다. 그래도 포졸들은 태어난 아이를 고개에 내팽개쳐 둔 채 신음하는 여인을 끌고 가서 서산 관아 사또 앞에 꿇어앉혔다.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난 사또는 대노해서 말하길,
"에끼, 이 인정머리 없는 놈들아! 누가 애까지 낳는 여인을 끌고 오라더냐! 당장 저 여인에게 먹을 것과 아이에게 입힐 것을 주어 집으로 돌려보내라. 산모와 신생아에게 드는 돈은 모두 내 월급에서 탕감하라."
인자한 사또의 명령대로 포졸들이 허겁지겁 아이를 버려 둔 학돌재에 당도해보니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어디서 날아왔는지 커다란 학들이 날개를 펴서 아이를 감싸고 있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아이의 이름이 춤추는 학이 돌보았다고 해서 춤출 ‘무’자 즉 무학(舞鶴)이 되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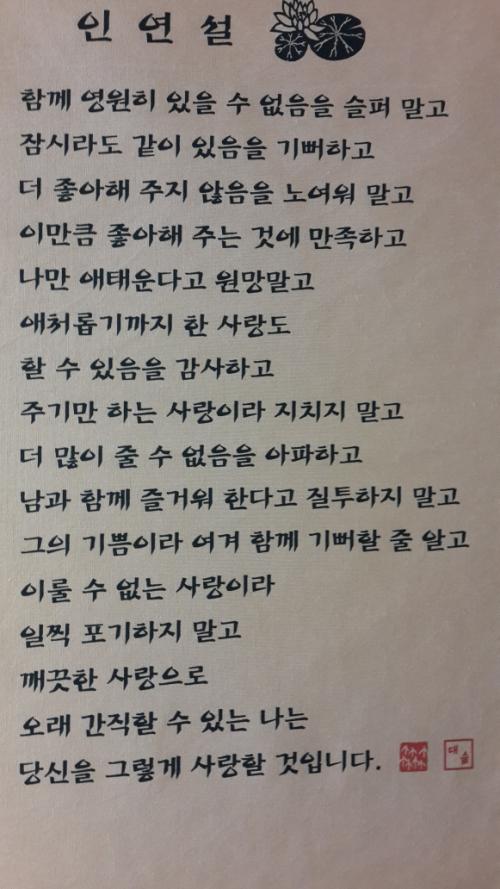
간월암 경내에 걸려있는 시 '인연설'간월암은 동서남북 어디에서 보더라도 아름다운 고찰이다. 바다 쪽에서 보면 육지가 배경이 되고 육지 쪽에서 보면 바다가 배경이 된다. 마침 ‘가던 날이 장날’이라고 가을바람이 몹시 불었다. 소금기를 머금은 해풍이 사정없이 귓전을 때리더니 끝내 모자까지 앗아갔다.
간월암 뒤뜰에 심어둔 대나무 밭에서 댓잎 서걱이는 우우 소리가 마치 바다울음소리처럼 들린다. 태곳적 추억을 상기시키듯 업장(業障) 소멸을 발원하는 듯, 길게 때론 가늘게 이어지는 바람소리를 들으며 간월암을 한 바퀴 돌아보았다. 모진 해풍을 막기 위해 절 주변에 시멘트로 단단한 옹벽을 쳤다. 옹벽마다 석화와 해초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어 세월의 운치를 더해준다. 좀더 바다 쪽으로 물러서서 관조하자니 하나의 성벽이라 해도 손색이 없겠다. 바다는 천혜의 해자(垓字)요 일주문만 닫아걸면 바로 난공불락의 요새인 셈이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절 주변을 돌고 나서 사람들을 관찰해보았다. 주5일제의 영향인지 관광객들이 꽤 많다. 대형버스를 대절해 온 사람들도 보이고 자가용을 이용한 가족단위의 나들이객들도 많았다. 관광객들의 얼굴도 사뭇 밝았다. 간월암의 수려한 풍광과 서해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에 한껏 취했음이리라.
두 시간 남짓 간월암을 친견한 뒤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경내엔 그 흔한 탑조차 없다는 점이다. 대신 탑이 있어야할 자리엔 오랜 세월 해풍에 시달린 늙은 사철나무 한 그루만이 외로이 서 있을 뿐! 그래, 탑마저도 한낱 미망일 터,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에 그리 중요하리요. 삼라만상 모두가 부처이고 진리인 것을.

간월암 경내 모습나의 감상적인 마음을 눈치라도 챈 것일까. 해는 금방이라도 자취를 감출 듯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머지않아 또 다른 손님들이 간월암을 감싸안을 것이다. 나는 아쉽지만 간월암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돌아오는 길, 여행을 유난히 좋아하는 친구가 말하길 다음번엔 간월암의 야경을 보러오자고 말했다. 그 말을 들으니 과연 간월암의 야경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졌다.
우리가 다음을 기약할 때 애마는 A방조제를 막 통과하고 있었다. 마침 바다와 접한 간월호 수면 위로 찬란한 5월의 석양 햇살이 부처님 미소처럼 환하게 번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