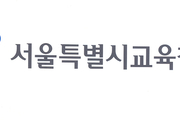교육수장의 퇴진과 함께 열린교육이 쇠퇴하고 있다. 거기에는 열린교육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넘기기식' 연수로 무리하게 보급하려는 행정에 큰 책임이 있다.
그러나 열린교육은 과거 주입식 교육과 비교할 때 참으로 훌륭한 교수-학습방법이다. 시간과 공간, 형식과 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실과에서 빨래하기 학습을 한다고 하자. 이 학습을 위해 과거 수업형태에서는 월요일 6교시에 빨래감 분류하기 40분, 수요일 실과시간에 세탁하기 40분, 그 다음 주 월요일 실과시간에 말리는 학습 40분, 수요일 다림질하기 40분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학습에 따라 30분이 소요되는 게 있고 90분은 해야 하는 게 있다. 그런데도 주어진 시간에 맞추느라 그 동안의 수업은 학습에 연속성을 갖지 못해 효율성이 떨어졌다. 이런 식의 수업은 시작은 있지만 수업과정과 끝맺음을 판단할 수 없어 사실상 한 개인이 어떤 과제를 완전히 해결했는지, 또 어디가 부족한지를 교사가 알 수 없다. 그래서 개별지도도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열린교육은 꼭 필요하다. 교사들은 요일별, 시간별 시간표를 짜지 말고 교과와 시간, 학습과제를 통합해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말고 연계해 수업을 재편성해야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과제수행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별활동시간, 체육시간, 음악시간 등을 모두 통합해 시행할 수도 있고 한 과목 수업을 일주일 내내 할 수도 있어야 한다. 물론 법정 수업일수와 수업시수 범위 내에서 말이다. 그럴려면 교사들의 피나는 노력이 필수다. 올 3월에도 60년대처럼 요일별로 분산된 시간표가 짜여지고 수업시간은 늘 40분이며 장소는 교실 책상 위, 손에는 교과서만 들고 수업이 진행된다면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교사가 바쁜 만큼 아이들의 성취도는 높다'라는 말이 열린교육에서는 정론으로 통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코너학습이다 뭐다 해서 교실을 넓히고 학습지를 만들고 부산을 떨었었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일 뿐 진정한 열린교육의 진수는 바로 수업의 내용과 방법에 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