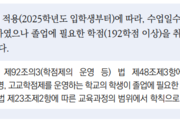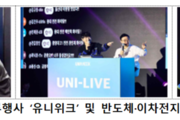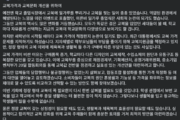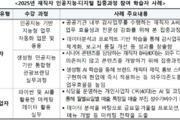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주가 지역대학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사회 활력 회복의 핵심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유학생 유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착으로 이어지지 않아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KEDI BRIEF 23호 ‘외국인 유학생 지역 정주와 대학·지자체 협력 과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정책 변화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 실태 조사(2024)’ 결과를 토대로 비학위과정 학생을 제외한 유학생의 약 45%가 대학 졸업 후 한국 체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취업을 통한 정착을 희망한 비율은 76%에 달했다. 또한 이들 중 약 60%는 대학 소재지와 관계없이 서울에서 취업하길 희망했는데, 일자리·문화·생활 인프라 등 정주 여건이 서울이 더 낫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정부 정책이 유학생을 단순한 ‘입학 자원’이 아닌 ‘인재 양성과 국내 노동시장 진입·정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됐음에도 지역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많은 지역대학이 유학생 유치뿐 아니라 비자 발급, 생활관리, 상담 지원까지 대부분을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어 장기 정주 체계를 갖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주 환경의 한계도 문제로 제기됐다. 보고서는 “유학생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주거·의료·교통·문화 등 기본 생활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일부 지역은 생활 접근성이 낮아 장기 체류와 지역 취업으로 이어지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대학과 지자체 간 협력 부족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현재 유학생 지원이 대학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지자체와 지역 산업체의 참여가 충분하지 않으며, 정주 정책을 지역 인구·산업 정책과 연계한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력 구조 재정비 방향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지자체는 주거·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학은 교육·적응 지원을 강화하며, 지역 산업체는 취업과 현장 경험을 연계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정윤 선임연구위원은 “유학생 정책은 단기 체류 지원에서 벗어나 정주와 취업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 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지역 정착 기반이 안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학생 정주는 지역대학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도 연결된 만큼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