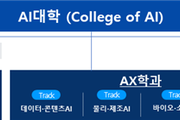사람이 평생의 직업으로 선택한 일을 해 나가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마도 언뜻 마음에 잘 와 닿지는 않겠지만 아름다움이란 요소도 과학의 길을 가게 하는 주요 동인 가운데 하나이다. 흔히 사람들은 과학자의 전형적 표상으로 자리잡은 아인슈타인의 외모를 보고 과학자들은 미적 요소에 무심하다거나 심지어 미적 감각이 없다고 여긴다.
그러나 부수수한 머리를 쓸어 넘기며 아득히 먼 곳을 응시하는 듯한 눈길 속에서 그는 과학적 진리의 아름다움을 줄기차게 추구해갔다.
과학사를 돌이켜보면 아름다움의 역할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리스의 유클리드가 쓴 '기하학원론'에는 '소수의 개수는 무한하다'는 정리의 증명이 있다. 그 논리적 정교함과 간결성이 뛰어나 일찍부터 '수학적 우아함의 전형'으로 여겨졌다. 18세기 스위스 수학자 오일러는 이라는 식을
세웠는데, 수학의 가장 중요한 5개 상수가 절묘한 형태로 결합되어 있기에 '수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식'이라고 부른다.
19세기 영국의 물리학자 맥스웰은 전자기파에 관한 4개의 미분방정식을 정립했다. 이로써 초속 30만km로 달리는 전파의 존재가 예언되었고 얼마 뒤 실험으로 검증되었다. 이에 감동한 볼츠만은 미분방정식에 대하여 "이 시구를 쓴 이는 과연 신이었던가!"라며 경의를 표했다. 20세기 영국의 물리학자 디랙은 스스로 완성한 단자극 이론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수학적으로 이토록 우아하고 아름다운 이론을 자연이 무시할 리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강한 믿음을 피력했다.
이처럼 자연의 근본 배경에 자리잡은 질서를 발견할 때 선인들은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느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은 애석하게도 우리의 일상적 감각과 잘 융화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관련된 개념들의 추상성과 난해함도 한 몫을 하며 자연의 본질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띠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다.
이런 괴리는 이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원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경험했다. 상대성원리는 누구나 이해할 대칭이라는 단순한 원리를 토대로 하지만 그로부터 유도되는 결론은 상식을 뛰어넘는다. 우리 존재의 근거인 대자연은 훨씬 경이로운 세계임에 비해 인간의 감각과 인식은 너무나 불완전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절감해야 했다.
현대 물리학은 물질의 궁극적 단위를 쿼크의 단계까지 밝혀냈다. 이 발견을 이룬 사람은 겔만과 츠바이크인데 츠바이크는 "사실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훌륭한 구도"라고 말했다. 여기에 관련된 이론도 한층 심화된 것이어서 사람들은 이를 '기묘한 아름다움'이라 표현했다.
그런데 '물질 분자 원자 소립자 쿼크'로 이어지는 유구한 탐구의 역사가 이것으로 마무리되지는 않는 듯하다. 쿼크 이론이 완성된 지 40여 년이 지난 요즘 '초끈'(superstring)이라는 가상적 존재가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다. 과연 이곳에서는 또 어떤 아름다움이 펼쳐질지, 과학의 미학에 또
다시 기대를 건다.
* 그동안 고중숙의 과학의 오솔길을 아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