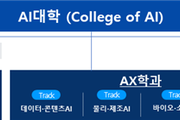'기하학에 왕도는 없다'는 고사는 흔히 '기하학 원론'을 지은 유클리드가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한 때 수학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간 적이 있다. 저명한 학자를 환대하면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이 기하학을 쉽게 배우는 방법을 물었을 때 그는 위와 같은 대답을 했다.
그런데 이보다 한 세대 전 알렉산더 대왕도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남겼다(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했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은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장수였다). 알렉산더 대왕은 대학자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여러 학문에 대하여 배웠는데 기하학은 메나에크무스라는 수학자에게서 배웠다.
학생으로서, 왕이 기하학을 정복할 지름길을 물었을 때 그는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의 길과 일반 백성들의 길은 다르지만, 기하학에는 모든 사람에게 단 하나의 길이 있을 뿐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유클리드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지만 생몰연대도 BC 300년 무렵이라고 추정될 정도로 생애는 신비에 싸여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중국의 장자(BC 369-289?)도 비교해볼 만한 일화를 남겼다. 장자는 도가사상 또는 노장사상의 대표자로 인정받으며, 여기에는 '도'(道)의 개념이 핵심을 이룬다.
하루는 동곽자(東郭子)라는 사람이 장자에게 물었다.
"당신이 말하는 도란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나 있지."
"좀더 분명하게 일러주십시오."
"개미와 땅강아지에 있다."
"꽤 시시한 것에 있군요."
"벼쭉정이에도 있지."
"점점 더 시시하군요."
"오줌이나 똥에도 있는걸."
그리고 장자는 이렇게 말한다.
"도가 어디에 있다고 한정해도 안되고, 모든 것을 떠나서 있다고 볼 수도 없네. 도는 어디에나 있는 것이니까."
두 선현의 이야기는 언뜻 상당히 다르게 느껴진다. 그러나 깊이 음미해보면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학문에 다가서는 데에 어떤 특별한 길은 없고 다양하기는 하지만 평범한 길밖에 없다는 점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평범한 길을 일컫는 데에는 정도(正道)란 말이 적절할 것으로 여겨진다. 학문의 길에 왕도는 없지만 정도는 필연코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유클리드의 '왕도는 없다'라는 부분부정문은 바로 '정도는 있다'는 긍정문의 뒷면이고, 좀더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도는 어디에나 있다"는 장자의 말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정도가 분명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것을 수학에서는 '존재정리'라고 부르는데, 이는 인간의 한계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바꿔 생각해보면 인간적 상황은 의당 그래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보물찾기는 보물이 없어서도 안 되고, 길을 다 알려주어도 안 된다. 있기는 하되 힘들여 찾아가도록 꾸며진 것이 진정한 보물찾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