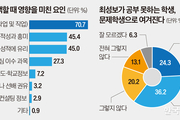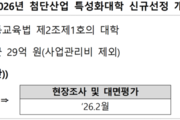나의 종례 역사
종례신문은 종례의 오랜 역사의 산물이다. 오래전부터 종례는 그야말로 마치는 예의 즉 인사만 했다. 일부러 마음먹은 일도 아닌데 어느 날부터인가 종례시간에 할 말이 없어진 데서 비롯된 것이다.
종례신문을 시작하게 된 사연인 즉슨 매일 종례 시간에 들어가서 조회사항을 반복하느니(시끄러워 말도 안 듣는데)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연구하다 종례신문을 생각해낸 것이다.
대형문구점에서 전지 절반 크기의 화이트보드를 사다가 교실벽 시간표 옆에 붙여 놓고, 수업시간 준비물, 과제, 전달사항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기록은 학습부장에게 보드마커
(흑, 적, 청)와 지우개를 주고 맡겼다. 그 후 종례시간에 들어가서 화이트보드를 가리키며 “얘들아 알지?”하면 학생들은 “네”하고 끝나게 됐다. 하루 종일 이 게시판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보게 되니까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그래도 기록하는 습관이 없는 학생들이 있어 좀 더 궁리를 해 보았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습관화된 ‘알림장’을 준비해 오도록 했다. 중학생이 됐으니 ‘플래너’라고 이름만 바꿨다. 그리고 원래 다른 요일이던 HR시간을 학생부에 건의해 월요일 1교시로 변경하고 이 시간을 활용하기로 했다.
일단 학생들에게 플래너를 책상에 꺼내놓도록 한 후 요일별 행사나 준비물 등을 칠판에 적으면서 설명을 곁들여 안내했다. 그리고 이를 학생들 각자의 플래너에 기록하도록 했다. 이 때 교사인 필자 역시 조그만 수첩에 같이 기록했다. 플래너에 기입한 것을 검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적지 않는 학생들도 있었을 테지만 강제성을 두지는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