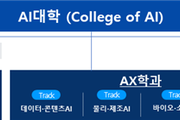중학 시절 수학을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수는 신이 만들었고, 다른 수는 모두 인간이 만들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을 갖고 있을 것이며('정수' 대신 '자연수'로 인용하는 곳도 많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는 의문도 품어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수학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다. 오히려 그 배경을 파헤쳐 보면 우리에게 해롭다고 할 편견이나 선입관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도 여러 교재에는 적절한 설명 없이 그저 이 말만 실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쓸데없는 오해와 의구심만 조장하고 있다.
이 말은 독일의 수학자 크로네커가 남겼다. 그의 전공분야는 정수론이었는데, 정수에 대한 그의 열정은 학자적 양심을 넘어 광신에 가까웠다. 그가 살았던 19세기에는 이미 정수는 물론, 유리수, 무리수, 복소수에 이르는 다양한 수 체계가 널리 받아들여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정수를 조합해서 얻는 유리수까지만 인정했을 뿐 무리수의 이상의 존재는 부정했다.
"무리수가 실재하지 않는 터에 가 초월수란 점을 증명한들 무슨 쓸모가 있는가"라고 말하기도 했다.(초월수는 무리수이되 'x에 관한 n차 방정식'의 근이 아닌 수를 말한다. 원주율 , 자연로그의 밑 e 등이 초월수로 알려져 있다)
이 점에서 그는 고대의 수학자 피타고라스와 상통한다. 잘 알다시피 피타고라스는 '무리수의 아버지'라고 불러도 좋을 사람이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그는 자식이나 다름없는 무리수를 사생아처럼 취급했고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수의 존재를 절대로 외부에 발표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히파수스라는 제자가 이 엄명을 깨고 말았다. 피타고라스는 이에 격분, 제자들을 시켜 그를 물에 빠뜨려 죽게 했다고 한다.
크로네커도 제자 뻘인 칸토어를 핍박했다는 점에서 피타고라스와 비슷하다. 칸토어는 집합론의 창시자로 가장 유명하며, 초월수와 무한대 등을 주로 연구했다. 대학 시절 크로네커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으므로 그의 제자라고 볼 수 있는데, 나중에 할레라는 소도시의 대학에서 교수직을 얻었지만 언젠가는 베를린대학에서 연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의 연구분야는 이미 베를린대학을 장악하고 있는 크로네커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그래서 그곳에 자리를 얻기는커녕 격렬한 공격을 받았다. 이런 일이 직접적 원인인지는 불명이지만 칸토어는 정신병원에 수감되었고 그곳에서 비참한 생애를 마쳤다. 하지만 오늘날 칸토어의 업적은 크로네커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가 창시한 집합론은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지며 이후 항상 수학의 가장 첫 머리에 등장한다는 데에서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결국 크로네커의 말은 편견일 뿐 수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어떤 의미를 부여할 올바른 견해가 아니다. 이와 비슷한 예들은 다른 곳에서도 많이 발견되며 그 원인은 깊이가 없는 '수박 겉 핥기'식 교육을 꼽을 수 있다. 학생들에게 넓이와 깊이가 조화된 올바른 학문관을 심어주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