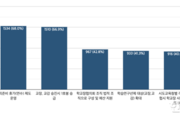설레는 3월이다. 몇 학년을 맡게 되었는가? 어떤 아이들을 만났는가? 혹시라도 말썽꾸러기 꼬리표를 달고 온 아이들이 우리 반에는 없는가? 교실 위치는 어디인가? 남향인가? 계단 옆인가? 동학년의 구성은 어떠한가? 내 이웃 반 동료교사는 누구인가? 등으로 시작해서 학교업무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맡게 되었는지 아니면 전혀 생소한 업무를 맡아 걱정이 되는지 등에 의해 교사의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시기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사는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는가에 따라 평상심을 되찾고 일상으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불평스런 마음을 참지 못하고 결정권을 가진 이에게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든지 한다.
내가 원하던 상황이 아닐 때 대개의 교사들은 다소 마음과 기분이 상하더라도 속으로 삭인다. 관리자인들 내게 이렇게 하고 싶었겠나? 어쩔 수 없는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지만 왜 나만 희생해야 되지? 하는 반문으로 씁쓸한 기분을 느끼면서 말이다.
그나마 최후의 판단은 아이들을 보고 나서 해도 되므로 일단 교실에 들어와서 약간 어색한 분위기로 앉아 있는 아이들을 쭉 살펴본다. 첫날은 대개 아이들도 긴장해서 새 담임선생님과의 만남을 낯설어하거나 주변 친구들을 탐색하면서 나름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에 그런대로 교실 분위기가 조용하다. 그런데 이런 긴장감은 며칠뿐 여전히 자유본능 아이들이 틈새를 이용해서 장난을 치며 슬슬 새 담임선생님의 눈치를 살핀다. 노련한 선생님은 이런 녀석들의 속마음을 눈치채고 모른척하는 행동을 거듭하다 결정적인 상황에서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면서 카리스마를 발휘하기도 한다. 선생님의 목표는 그 녀석으로 하여금, ‘우리 선생님 고단수라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전략이 먹혀들지 않고 그 녀석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슬슬 거슬리기 시작하면 순조롭게 넘기기가 힘들다.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럴 때 선생님은 다음 중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는지 생각해보자.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