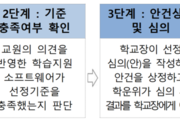5월 7일 오후 2시, 한강역사 탐방 참가자들이 한양대역 4번 출구로 나가는 길목에 모여들었다.
가장 많은 숫자가 참여하여 10여 명 정도였다. 김효 해설사의 탐방 개요를 안내받고 처음 찾은 곳은 행당중학교 앞에 있는 전관원 터를 찾았다.
전관원은 교통요지에 자리잡은 숙박시설
이태원, 홍제원, 보제원 그리고 전관원은 한양의 4대 원(院)이었다. 그중에 이태원과 홍제원은 현재 지명으로 남았다. 이태원은 특히 유명하다. 그런데 전관원은 왜 그 흔적이 사라졌을까. 왜 지명으로도 남지 않았을까. (이태원 외에 지명으로 남은 원이 있다. 남양주 퇴계원, 경기도 장호원, 충청도 조치원, 북한의 사리원 등등)
조선 시대에도 사람들은 오갔다. 한양과 지방을 연결하는 길이 있었다. 나랏일을 하는 사람이나 여유가 있는 사람은 말을 타고 다녔겠지만, 백성들은 걸어서 다녔다. 길이 멀면 숙박도 한다. 나라에서 만든 숙박시설을 원(院)이라고 했다. 나랏일을 하는 이들이 말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역(驛)이다. 원은 역과 같이 있었다.
광희문 밖에 위치했던 전관원(箭串院)은 서대문 밖의 홍제원, 남대문 밖의 이태원, 동대문 밖의 보제원과 함께 도성 밖의 4대원 중 하나였다. 처음에는 관영이었으나 언제부턴가는 일반 나그네들도 묵어가던 민영 숙박업소로 바뀌었다고 한다.
그런데 한양을 코앞에 두고 왜 이런 숙박시설을 둬야 했을까. 특히 전관원은 나루를 건너 왔지만 도성의 문이 닫혀서 들어가기 어려운 이들과 이른 새벽에 나루를 건너려는 이들이 묵어갔다고 한다.
살곶이다리가 위치한 곳은 청계천이 중랑천과 만나는 자리 부근인데, 현재 한양대학교에서도 내려다보면 여기가 바로 보인다.

이곳에 다리를 놓게 된 계기는 태종의 잦은 행차 때문이었다고 전해진다. 태종은 세종에게 왕위를 양위한 뒤에 약 4년 간 유유자적하며 지내면서 낙천정과 풍양궁을 오가며 거처했는데, 이렇게 다니면서 중랑천을 편히 지나기 위해 다리의 설치를 계획하게 되었다고 한다. 다만, 다리를 놓게 된 계기를 마련한 태종은 정작 살곶이 다리를 이용해보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살곶이 다리는 '제반교(濟磐橋)', '전곶교', '전관교(箭串橋)'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나, 사실 제대로 된 이름은 '살곶이 다리'나 '전곶교'가 맞는 것이라고 한다. 특히 한자 이름인 ‘箭串橋’는 ‘전관교’로 읽기 십상인데, 여기서는 ‘전곶교’로 읽는 게 옳다고 한다.
'살곶'이라는 특이한 명칭의 유래는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이성계)는 아들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거쳐 태종으로 등극하자 함흥으로 내려가 은둔했다. 신하들의 간곡한 청으로 함흥에서 돌아오는 태조를 태종은 이곳 중랑천에서 맞이했는데, 이때 태조가 태종을 향해 활을 쏘았다고 전해진다. 날아간 화살은 빗나가 땅에 꽂혔고, 그 이후로 이 지역을 '화살이 꽂힌 곳'이라 하여 '화살꽂이'에서 '살꽂이'를 거쳐 ‘살곶이’라는 지명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다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다리로 모두 64개의 돌기둥을 사용하여 만들었다. 돌기둥의 모양은 흐르는 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마름모형으로 고안되었다. 1920년대 서울에 내린 집중호우로 다리의 일부가 떠내려 가서 70년대에 다시 고쳐 지었으나, 다리의 오른쪽 부분에 콘크리트를 잇대어 복원함으로써 원래의 모습을 다소 잃었다.
기동차의 흔적
기동차를 운영한 경성궤도회사는 승객 유치를 위한 별도의 사업을 펼치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뚝섬유원지 운영이었다.
뚝섬유원지는 1934년 7월 경성궤도주식회사가 동뚝섬역 인근 한강 변에 유원지, 수영장, 어린이 놀이터 등을 만든 데서부터 시작됐다. 교외 소풍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승객 확대를 꾀하는 의도가 있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유원지역도 신설했다.
기동차는 주로 승객을 운송했지만, 화물도 실어 날랐다. 왕십리와 뚝섬 일대는 조선시대부터 채소류 경작지로 유명했다. 그래서 1930년대 이후에 기동차는 서울 도심으로 농산물을 실어 나르는 화물차 역할을 했다.
기동차는 인분을 운반하기도 했다. 청계천 변 기동차 역 인근에는 서울의 인분이 모이는 저장소가 있었다. 기동차는 이곳에 모인 인분을 왕십리와 뚝섬 일대로 실어 날랐다. 서울의 인분은 왕십리와 뚝섬 일대의 농경지에 거름이 되었다.
기동차는 해방 후와 전쟁 후에도 달렸지만 다른 교통수단에 밀려 퇴장하게 되었다. 서울시가 1953년에 기동차 사업을 인수했고 1961년에 폐지를 결정했다. 기동차가 완전히 운행을 멈춘 건 1966년이었다.
기동차가 폐지된 후 기동차가 다녔던 궤도는 싹 걷혔다. 그래도 길을 모습을 눈여겨보면 기동차가 다녔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성수동에는 이런 흔적이 남아 있다. 일정을 마치고 뚝섬역에서 탐방일정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