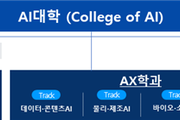몇 년 전 출간된 외국의 한 교양과학 서적을 읽던 중 온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 K'가 쓰여진 것을 본 적이 있다. 지은이는 영국 유명 대학의 교수이자 여러 책을 쓴 과학저술가였기에 기이한 느낌마저 들었다. 예전에는 온도의 단위로 섭씨(℃)나 화씨(℉)를 썼다. 이들 단위는 제안자인 셀시우스(Celsius)와 파렌하이트(Fahrenheit)의 이름 첫 글자에 '도(度 degree)'를 뜻하는 ' '를 붙여서 만들었다.
그러나 1967년 과학 분야에서 사용할 온도의 국제적 표준 단위를 제정하면서 영국의 물리학자 켈빈(Kelvin)을 기려 'K'를 쓰기로 했다. 이 새 단위에는 ' '를 붙이지 않았는데 이는 각도를 나타내는 ' '의 혼용은 불합리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최근 우리나라의 한 석사 논문에서도 ' K'가 쓰여진 것을 보았다. 화학 전공자의 논문이었기에 상당히 착잡한 느낌을 받았다. 물론 사소한 일로 넘길 수도 있지만 이공계 경시 풍조가 널리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계와 교육계에서조차 근본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지는 현상을 드러내는 하나의 상징처럼 여겨져 더욱 그러했다.
1999년 미국의 우주탐사선이 화성으로 가던 중 실종되어 막대한 경제적 손해와 함께 나사(NASA)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 그런데 원인은 컴퓨터 프로그램 안의 미터법과 파운드법 간 단위 환산이 잘못된 데에 있었다. 근본을 소홀히 한 결과가 결코 작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하겠다.
오늘날 자연현상을 기술하는 데에 쓰이는 기본단위로는 길이, 질량, 시간, 전류, 온도, 광도, 물질량을 나타내는 7개의 단위가 선정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과학에서 널리 쓰이는 단위들을 합리적으로 정립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국제단위계'라 부른다. 이 체계는 프랑스가 주도하므로 약칭으로는 Le Syst me International d'Unit s란 용어를 줄인 'SI'를 쓴다. 비유하자면 7대 기본단위는 '단위의 원소'라고 말할 수 있다.
자연계의 모든 물질이 100여종의 원소로 구성되듯 과학에서 쓰이는 모든 단위는 이것들의 조합으로 표현된다. 수학에서도 합성수는 소수의 곱으로 나타내진다. 이 점에서 기본단위는 소수에도 비유된다. 따라서 원소와 소수 못지 않은 비중으로 다루어야 한다.
한 가지 특기할 것은 원소나 소수와 달리 기본단위는 사람이 정한 것이기에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정의도 변한다는 점이다. 대표적 예로는 기본단위 중에서도 기본이랄 수 있는 '미터'가 꼽힌다. 1790년 처음으로 1m를 정할 때는 지구 둘레를 측정하고 그 4000만 분의 1로 삼았다.
하지만 정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과학적 요구를 따를 수 없었고, 마침내 1983년에는 빛이 진공 중에서 299,792,458분의 1초 동안 진행하는 거리로 바꾸었다. 다른 단위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요컨대 기본단위의 변천사 자체에도 과학의 진보가 스며있음을 되새겨 계속적인 주의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