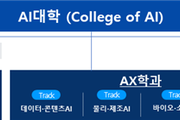과학을 배우다 보면 신비로운 현상들이 참으로 많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만유인력도 한 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광경을 보고 이 원리를 떠올렸다고 한다. 그런데 그는 사과가 떨어지는 것과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 서로 같은 현상이란 점을 또 어떻게 떠올렸을까.
예를 들어 박찬호 선수가 야구공을 힘껏 던지면 백 미터 가량 날아갈 것이다. 하지만 공과 지구와의 인력 때문에 결국 떨어지고 만다. 만일 총알이라면 좀더 멀리 갈 것이다. 거대한 로켓에 의해 발사된 인공위성은 지구를 한 바퀴 이상 돌 거리까지 날아갈 수 있다.
다시 말해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돌아다니는 것은 사과 야구공 총알 미사일 등처럼 지구를 향해 떨어지는 현상이다. 다만 떨어져 땅에 닿기 전에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주변에는 공기도 거의 없다. 따라서 한 바퀴를 돌고 나더라도 속도는 거의 줄어들지 않으며 이를
바탕으로 똑같은 떨어짐으로서의 회전운동을 하염없이 되풀이한다.
그런데 뉴턴의 시대에는 인공위성이 없었다. 그는 인공위성 대신 자연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행성들을 떠올렸다. 곧 지구를 비롯한 모든 행성들은 태양을 향해서 끝없이 떨어지는 운동을 되풀이한다. 이 현상이 바로 공전이며, 그 근원은 모든 물질적 실체에 존재한다는 '만유인력'이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이와 같은 '만유인력'으로서의 '힘'이란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명한 일반상대성이론을 통하여 그는 만유인력이란 현상은 실제로는 공간의 휘어짐이며, 그로 인한 물체들의 회전 운동은 그 휘어진 공간에서의 직선 운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쯤에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다. 똑같은 현상을 두고 두 천재가 서로 다른 생각을 이야기할 때 과연 어느 것이 진실일까. 우리는 그들보다 뛰어난 존재도 아니고 절대의 신은 더더구나 아니다. 따라서 오직 드러나는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태양 주위에서 빛이 꺾인다는 점을 정확하게 예측한 일반상대성이론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런 내용을 배울 때 우리는 신비로움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움을 겪는다. 고교 시절 배웠던 만유인력은 이제 폐기하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만유인력이란 관념의 영향이 너무 컸기에 이를 저버리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일반상대성이론을 본격적으로 파고들 진지한 물리학자가 될 사람이 아닌 경우 보통 만유인력적인 해석으로 만족해버린다. 결국 보다 진실에 가까운 이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상이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이론을 택한다.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천재들이 품은 생각이라 한들 절대적 진리와 완전히 합치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고 보면 사람은 누구나 실상 같은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진실을 너무 외면해서는 곤란하다. 각자의 삶에 가장 적절하되 가능한 한 최선의 진실에 가장 가까운 환상을 추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