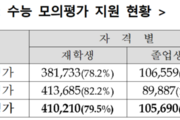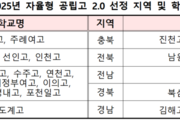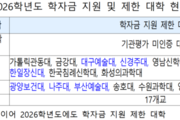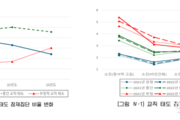20여 년간 ADHD, 학습장애, 난독증 등을 임상적으로 경험하고 치료해온 필자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보이는 행동의 원인을 이해하지 않고는 절대로 학생들을 제대로 교정해 주거나 도와줄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연재 내용 중 문제 행동의 원인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중시하는 임상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밝은 형광등 아래에서 눈이 불편한 학생이 있다. 이 학생은 시간이 지나면 책 읽기가 불편해지고 결국에는 졸리거나 책을 덮어버린다. 외부에서 관찰하는 입장에서 이 학생은 책 읽기를 싫어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책 읽기를 싫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초점을 맞춘다면 결국 이 학생은 학습부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다른 경우, 음성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말을 주저하고 이로 인해 의사소통능력이 떨어져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있다. 이 학생을 성격이 소심해서 그렇다고 판단하고 소심한 성격을 바꾸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이 학생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예들에서 보듯이 신경학적인 문제로 혼란을 겪는 학생들은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낀다. 불편함이 누적되면 스트레스로 인식되며 이런 상태가 오래가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회피행동을 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귀에서 들어오는 음성정보를 제대로 여과하지 못해 과부하가 걸리는 학생은 교실에서 수업 중 선생님 강의에만 집중하지 못한다.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 창밖을 내다보거나 옆 학생을 괴롭히며 장난을 치게 된다. 또 촉각이 예민한 학생은 헐렁한 옷 대신 날이 빳빳한 옷을 입고 학교에 갈 경우 이것이 피부를 예민하게 하기 때문에 몸을 긁거나 가만히 있지 못해 움직이게 된다. 이 두 경우 모두 겉으로는 수업에 집중 못 하는 산만한 학생으로 보이는 것이다.
앞의 예들은 주로 감각이 예민한 경우인데, 감각정보에 보통보다 둔감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변 인식의 폭이 좁은 학생의 경우에 걸어가는 동안 내려다보면서 걸음 하나하나를 조심하지만 주변의 모든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는 않아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 이것은 시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적은 양의 시각 정보가 근육과 관련과 통합하지 못해 보폭 조절이나 장애물을 피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경향을 보면 학습부진의 ‘원인’은 무시되고 ‘결과’만을 교정하려다 보니 학교 내에서 학습부진 학생들을 도와주는 방법이 보충학습에만 매달리는 것이 대부분의 처방이었다. 결국은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니 학생이 지속적 성장 가능하도록 관리를 할 수가 없게 된다.
하천의 경우로 예를 들면 상류의 수질오염은 반드시 강 하류에 영향을 미치는데 상류의 문제는 무시한 채 하류의 수질개선에만 매달리는 것과 같다. 엄청난 시간과 경제적 낭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감각정보처리는 일종의 상류에서의 문제로 보면 된다. 우리는 이제 이 문제에 주목하고 학습부진 학생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