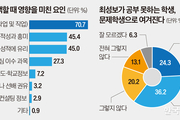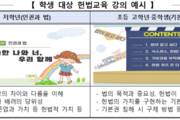시 부문에서 가장 개성이 두드러진 작품은 가작 ‘매미 울음을 볶다’이다. 이 시는 ‘울음’이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볶는다’라는 시각적 이미지와 결부시킨 점이 놀라웠다. 어머니 첫 기일 날 ‘재수생, 대학생’과 ‘큰어머님, 작은어머님, 고모님, 누님들’로 표현된 식구들이 모여 제사음식을 마련하는 과정을 퍽 활달하고 진솔하고 해학적으로 그려졌다. 그렇지만 이 작품을 가작으로 선정한 것은 당선작에 비해 작품의 완결성이 좀 떨어진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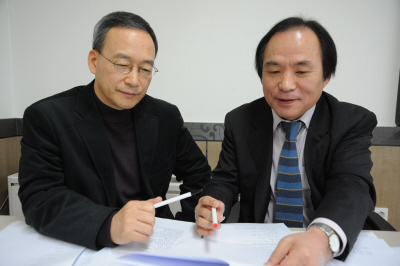
당선작 ‘꿈꾸는 장롱’은 시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었다. 시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완결돼야 문학성이 높아지는가를 나름대로 알고 있다고 하겠다. ‘장롱 속에 처박힌’ 옷에 대해 ‘나프탈렌 냄새나는 것일망정/ 바람을 쐬어 주어야 해/ 그래야 수의로 입을 수 있는 거야’라고 표현한 부분이 이 시의 백미다. 입지 않고 장롱에 처박아 둔 평범한 일상의 옷을 ‘수의’의 차원으로까지 끌어올림으로써 죽음을 성찰하게 하는 은유의 힘이 크게 돋보였다.
동시 부문은 눈에 확 띄는 이렇다 할 작품이 없었다. 교사들이 아이들보다 동시를 못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일었다. 어른이 동심을 지닌다는 것, 또 그 동심을 동시의 그릇에 담아 표현한다는 것이 그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해주었다.
당선작 ‘콧구멍 파는 아이’는 아이의 시선으로 아이의 마음으로 쓴 점을 높이 샀다. 코딱지를 친구 손에 쥐어주고 도망간 아이나, 그게 화가 나서 뒤쫓아 가는 아이의 모습이 눈앞에 그대로 환하게 그려져 웃음을 자아내는 퍽 재미있는 동시라고 여겨졌다. 가작 ‘시계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른의 생각을 아이의 생각답게 쓰려고 노력한 시라고 할 수 있다. 어른의 심상이 느껴지지 않도록 보다 심사숙고했더라면 보다 더 좋은 동시가 될 뻔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