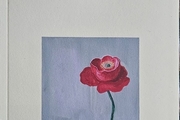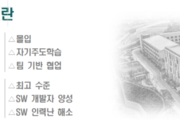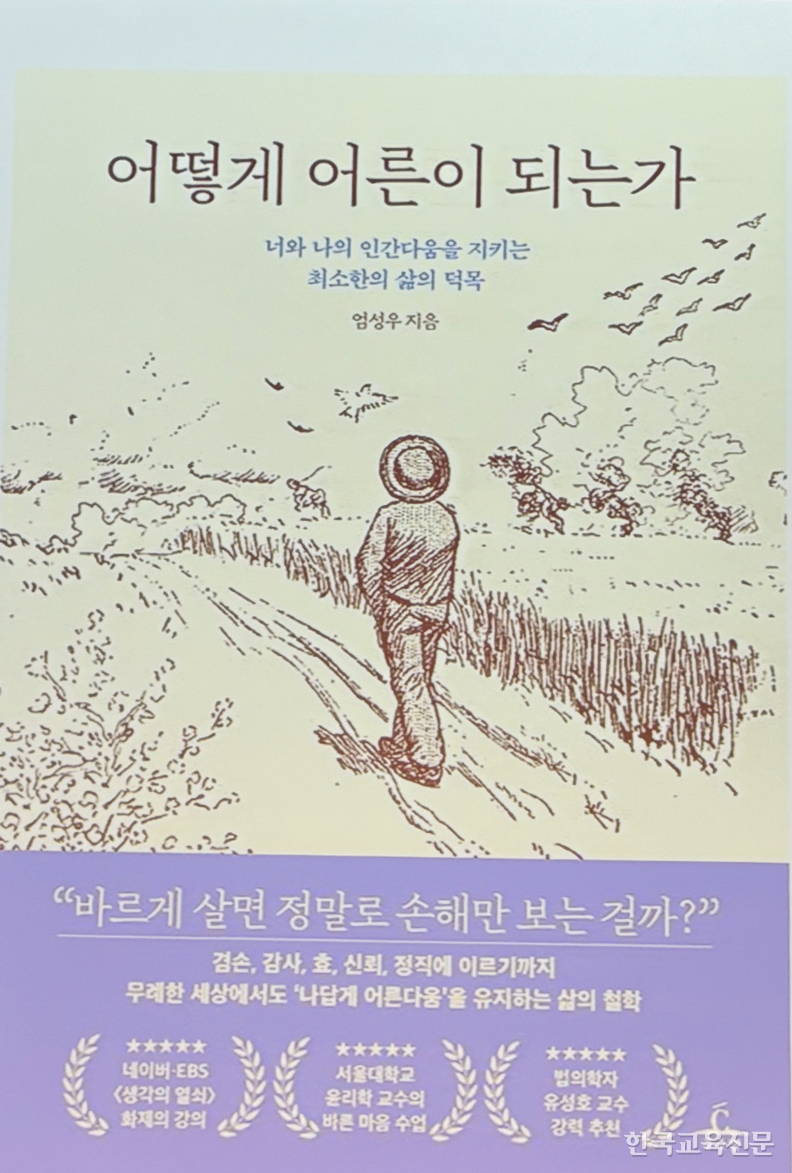
< 우리 사회는 어른이 없는 시대, 어른 되기를 주저하는 시대다. 꼰대보다는 '좋은 어른'이 되고 싶은 기성 세대, 삶의 이정표를 찾고 싶은 미래세대, 세대 간 '벽'이 아닌 '다리'를 놓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묻고 함께 길을 찾는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보교육재단은 지난 17일 '어른없는 사회: 불안의 시대, 어른다움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2025년 교육심포지엄을 교보빌딩 23층 대산홀에서 개최하였다.
단절, 불통, 내로남불, 어른이 없는 시대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질문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른’은 어떤 존재인가요?” 한때 존경과 동경의 대상, 버팀목이자 울타리였던 ‘어른’은 오늘날, 누군가에게는 조롱과 단절의 멸칭 ‘꼰대’로, 누군가에게는 유예하고 싶은 부담스러운 미래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신뢰하기 어려운 존재로 이야기 되고 있다.
강연 1부에서 엄성우 교수(서울대 윤리교육과)는 <'어른 지망생'을 위한 커스터마이징 안내서>를 주제로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저서를 소개로 말문을 열었다. '완성된 어른'이라는 환상 대신, 어른 지망생이라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 시대는 '반꼰대 문화'를 통해 강요하지 않는 자유사회가 되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부재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유명한 사람이나 셀럽의 말에 무비판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꼰대는 정해진 답을 주려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길을 강요하는 존재요, 어른은 열린 질문을 던지고 바람직한 길을 삶을 통해 직접 보여주는 존재라고 정의했다.
현 시대의 어른 되기는 김소영 작가의 '어떤 어른'을 사례로 들었다. 어른됨의 본질은 책임에 있으며, 자율성과 주체성을 넘어,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존재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칭한다. 또한, 자녀를 키우며 세대 간 연결을 깨닫게 되며, 점으로만 보였던 세대가 선으로 연결되는 순간, 어른의 의미가 깊어진다. 어른다움은 획일적인 인격이 아니라, 무수한 관계 속에서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조율하고 다듬어가는 커스터마이징된 윤리이자 태도로 스마트 폰 설정을 조정하듯 인생의 덕목도 자신에 맞게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강의로 김찬호 교수(성공회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빙교수)는 <꼰대의 탄생 : 이해 없이 끊어진 관계의 사회학>을 주제로 "'꼰대'라는 단어에는 불통, 위계, 구시대성에 대한 냉소와 단절의 감정이 스며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시대의 기성세대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묻는 언어이기도 하다. 그들이 무엇을 견뎌야만 했고 어떤 시대를 살았기에 꼰대가 되었는지 살펴보는 동시에 미래세대와의 관계 복원과 화해를 모색하는 시간"을 강조했다.
2부에서는 김미소 강사(듣는연구소협동조합 연구원)가 <청년들이 그리는 어른의 초상>을 주제로 청년들이 '어른'을 어떻게 경험하고 갈망하는지 이야기 했다. 전통적인 관계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지만, 청년들은 여전히 가까이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를 갈망한다. 그러한 대상을 '어른'이라 부른다면, 우리는 어떤 새로운 어른의 초상을 함께 그려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이어서 정민승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는 <'소문자 어른'의 탄생 조건: 관계, 책임, 그리고 교육>에서 "이 시대는 모든 사안을 꿰뚫는 혜안을 가진 대문자 어른'이 더 이상 불가능한 시대다. 이제는 각 영역에서 소소한 어른됨을 구현하는 '소문자 어른'이 필요하다. 소문자 어른은 어떤 품성일까. 소문자 어른들은 어떤 사회적 조건 하에서 탄생할 수 있을까. 그 어른다움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는 문화와 교육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AI 광풍이 몰아치는 시대, 새로운 어른의 탄생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탐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