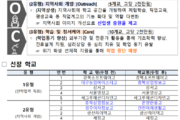두물머리에서 보는 하늘은 파란빛이 더욱 깊다. 하늘이 강물에 어울리면서 옥빛이 진해진 탓이다. 하늘을 보고, 강물을 보고, 다시 하늘과 강물을 반복해서 보니, 이내 옥빛은 그윽해지면서 가슴으로 적셔온다. 강 건너 풍경도 산 아래 포근히 안겨있다. 듣기에 이곳은 아침에 피어나는 물안개와 일출이 황홀하다고 한다.
느티나무가 강물의 흐름을 말없이 지키고 있다. 나이가 400년이 넘었다고 한다. 긴 세월을 버텨왔는데, 몸집만 크지 거친 구석은 없다. 오히려 온화한 수관이 아름답게 다가온다. 이 풍경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 촬영 장소로 자주 이용되나 보다. 지금도 사진을 찍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느티나무 아래서 강물을 본다. 이곳에서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난다. 만나는 것은 우연이든 필연이든 숙명 같은 것이다. 작은 물줄기가 만나고 만나서 큰 강물처럼 흐르다가 상대방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물줄기를 줄여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가 되고 힘을 내며 앞으로 가 큰 강이 된다. 만남은 새로운 시작으로 변화라는 창조적 힘을 만들어낸다.
강물이 다시 세상을 만나면 어떨까. 세상은 극단적인 목소리만 있다. 정치권은 여야로 갈라져 매일 시끄럽다. 서로 자기들만 옳다고 한다. 늘 국민의 대리인임을 내세워 실제로는 자기들만의 광범위한 정치적 권한을 누리고 있다. 비교적 간단히 해결할 것 같은 문제도 저들의 손에 가면 이상해진다. 자신들의 방식대로 판단한 해결책을 집요하게 주장하면서 문제만 복잡하게 키운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감시와 비판을 위해 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떠들지만, 이미 한쪽 편에 기울어져 있다. 사실적 진술은 깨알 같은 글자로 숨기고, 지지층의 입맛에 맞게 언어적 정의를 내린다. 정치와 사회가 던진 쟁점은 비난으로 덧칠하면서 결국은 조작된 여론으로 마무리한다.
학자도, 경제인도 낡고 쓰러져 가는 울타리 안에서 저희끼리 아우성친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무엇을 얻겠다는 건지. 싸움도 도를 넘는 것이 허다하다. 낡아빠지고 매력도 없는 기차를 타고 자기들만의 길을 간다. 끊임없는 이념 타령으로 자신들의 허구적 실체를 드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실체가 없는 싸움이지만, 국민이 받는 고통은 그대로 실재한다.
물론 필요하면 상대방을 향해 삿대질해야 한다. 무턱대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비판이 있어야 우리 사회가 탁월한 발전을 할 수 있다. 문제는 맹목적인 증오이다. 그리고 촌스러운 깃발 아래 몰려다니는 것이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적이 아니다. 마주하고 싸울 일이 아니다. 나와 함께 가야 할 사람과 싸운다면 이겨도 얻는 것이 없다. 마음만 불편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저 사람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이건 전혀 새로운 질문이 아니다. 내가 상대방과 평화롭게 살기 위한 결론이다.
다산 정약용은 가까운 남양주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이곳까지 와서 “도탄에 빠진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질문을 하며 답을 구했을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세상으로 나아가 꿈을 이루고 싶었다. 마침내 꿈을 이뤘다. 그러나 다산의 신념은 반대파에 짓눌려서 허공에서 흩어졌다. 시련도 가혹했다. 귀양살이로 말년을 떠돌고 말년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끝내 이루지 못한 꿈은 언어로 남겼다. 나라를 걱정했던 그 언어는 역사의 강물로 흘러와서 오늘날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워 주고 있다.
강물은 산 깊은 계곡에서 작은 지류들이 만나고, 또 만나면서 이루어진 물줄기다. 인간의 만남도 그렇다. 내 욕망을 걷어내고, 상대방의 소망을 봐야 한다. 강물이 숙명처럼 만나듯이, 얼굴을 맞대고 앉아야 한다. 그 과정에 무더위 같은 갈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무더위가 끝나면 가을이 오듯,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성숙한 만남으로 완성된다.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고민하는 남북 관계도 만나면 답이 보인다.
도심에서 조금 비켜 있는 곳인데도 침묵이 흐른다. 물결을 보고 있자니 치유의 파동이 마음을 따라 흐른다. 낯선 공간에서 풍경의 힘을 얻는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감성의 나눔을 할 줄 모른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삶을 더 낫게 하는 일보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해 마음을 써야 한다. 여야가 싸우는 궁극적인 목적도 여기에 있다고 믿는다.
강을 뒤로하고 걸어 나오니 할머니가 길거리에서 나물을 팔고 있다. 활기가 넘치는 관광객들 사이에 힘없이 앉아 있는 모습이 처연하게 아름답다. 저 모습은 이 땅에 권력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념일까.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가 여기에 있으면 좋겠다.